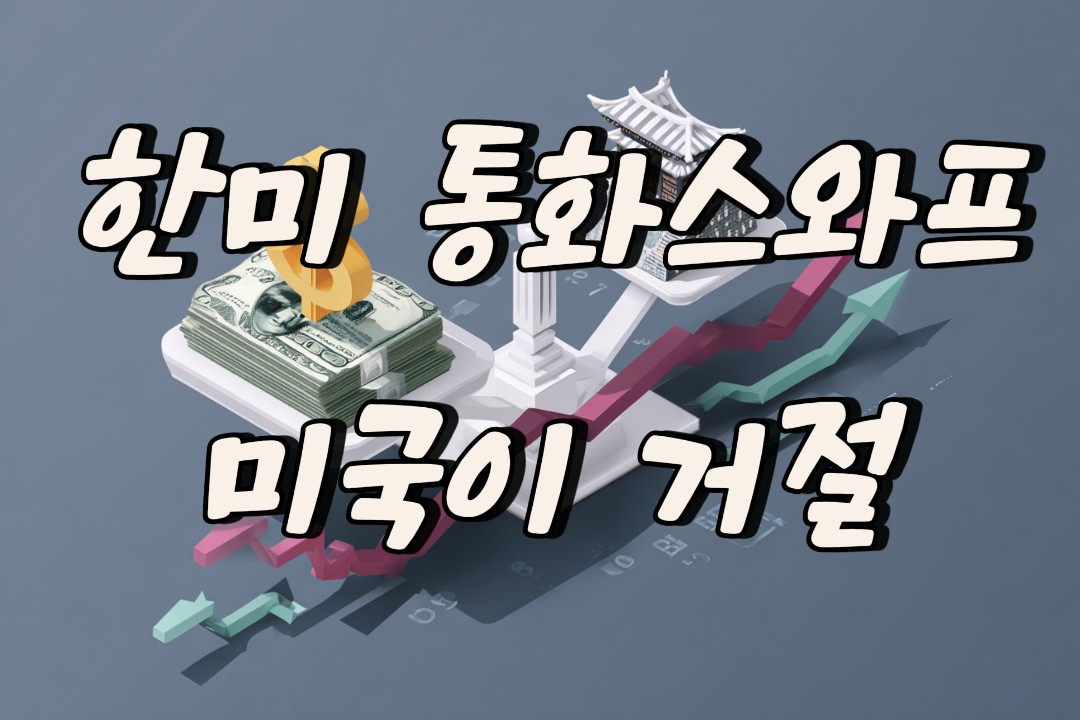최근 환율과 외환시장 얘기가 뜨거운데, 그 중심에 늘 따라붙는 단어가 바로 통화스와프입니다. 한국은 필요하다고 외치지만, 미국은 쉽게 손을 내밀지 않는 모습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 속사정을 쉽게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통화스와프,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사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에 ‘필요할 때 외화를 빌려 쓰고, 나중에 갚자’고 약속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죠. 정해진 환율과 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만기가 되면 다시 갚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위기 때 외화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선 꼭 필요한 안전판이기도 해요.
한국이 간절히 원하는 배경
지금 한국은 미국에 최소 3,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외환보유액이 약 4,100억 달러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면 달러 사정이 빠듯해질 수밖에 없죠. 저도 예전에 해외 주식에 목돈을 투자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부터 남은 현금이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달러 유동성을 지킬 수 있는 장치로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노”라고 말하는 이유
그럼 도대체 미국이 한국 통화스와프 거절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 환율 리스크
스와프는 정해진 환율로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 원화가 약세로 치달으면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환율 1,700원을 찍는 위기 상황이라면, 미국이 굳이 불리한 조건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거죠. - 스와프 비용 문제
현재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다 보니, 우리가 스와프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채가 늘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이 비용은 더 커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빚 많은 친구에게 돈 빌려주기 꺼려지는 심리와 비슷합니다. - 전략적 카드
미국은 원래 통화스와프를 ‘진짜 위기’에만 꺼내는 카드로 써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만 한시적으로 열어줬던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처럼 한국이 투자 때문에 스와프를 요청하는 상황은, 미국 입장에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은 되는데 한국은 왜 안 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본은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여기엔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은 엔화가 기축통화에 포함돼 있고, 안전자산으로도 취급됩니다. 게다가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사주면서 미국 경제에 든든한 뒷받침 역할을 해왔죠. 반면 한국은 아직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외환시장 사이즈도 일본과는 차이가 큽니다.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을 곁들여서 본다면
저는 IMF 시절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뉴스에서는 “외환보유액 충분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죠. 그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한국 통화스와프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서도, 결국 미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리스크를 떠안고 싶지 않다는 게 본심이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미국의 계산법은 단순합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한국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환율이 이미 크게 튀고, 한국 자산이 저평가된 시점,그때야 통화스와프를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야 본인들은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시장 안정과 동시에 헐값에 쇼핑까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한국이 절박하게 원할 때는 쉽게 응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스와프를 기대하기보다는, 환율·금리·외환보유고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대비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 통화스와프 거절하는 이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뉴스를 볼 때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떠나 그 뒤에 숨어 있는 논리를 이해하면, 여러분도 훨씬 깊이 있는 시각으로 경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