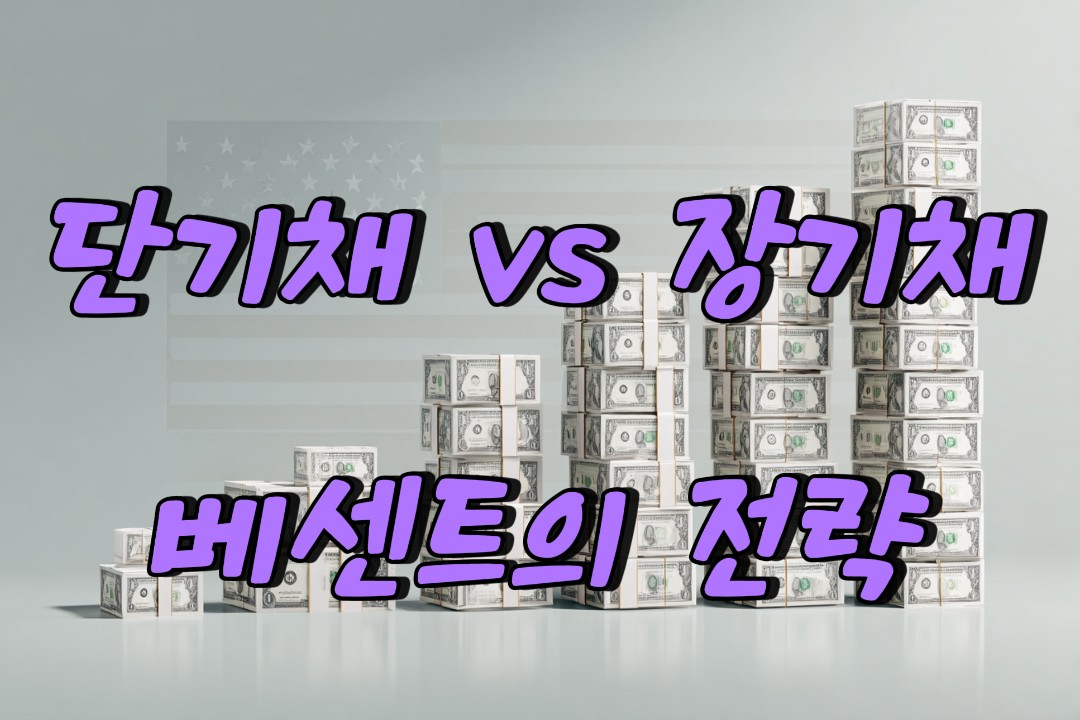미국 재정의 숨겨진 전략, ‘베센트’ 장관의 국채 발행 꼼수
얼마 전부터 경제 뉴스에서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이름이 자주 들립니다. 특히 제가 금융 관련 뉴스를 챙겨보는 이유는, 몇 년 전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사태를 직접 경험하면서 포트폴리오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죠. 미국의 국채 발행 방식 하나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올해 3분기에만 1조 7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시장에 소화시킬 것이냐인데, 그 해법이 다소 파격적입니다.
단기 위주의 발행 전략
지난해만 해도 베센트 장관은 전임 옐런 장관의 단기 위주 발행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단기물 비중을 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기물보다 단기물 발행이 쉬운 이유는, 매수 주체가 다양하고 즉각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MMF(머니마켓펀드)나 개인 투자자가 단기물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죠.
저 역시 예금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 단기물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짧은 만기는 매력적이지만,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기업 자금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백’이라는 두 번째 카드
베센트 장관이 꺼낸 또 다른 전략은 ‘바이백’입니다. 이는 재무부가 시중에서 기존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언뜻 들으면 ‘돈이 없어서 발행한 국채를 왜 다시 사들이나?’ 싶은데, 의도는 장기 금리 안정에 있습니다. 단기물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장기물을 매입하면, 장기물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물론 이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발행량에 비해 매입 규모가 작으면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만으로도 금리 변동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꽤 유효합니다.
시장 자금의 한계
문제는 MMF 시장의 소화 능력입니다. 현재 MMF 시장 규모는 약 7.5조 달러인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단기물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발행되는 단기물 규모를 감안하면, 시장이 이를 전부 받아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연준이 개입해 단기 금리를 낮추거나 직접 매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도 투자자로서 연준의 개입 타이밍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리 방향성이 달라지면, 단기물과 장기물의 매력도가 순식간에 뒤바뀌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복병
베센트 장관의 전략이 중간 선거 전까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난다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최근 미·중 무역 마찰과 상호관세 부과가 확대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가 다시 오르면 장기물 금리가 뛰고, 이는 국채 발행 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사점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며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은 단순히 수치나 금리 그래프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정치 일정, 무역 정책, 그리고 시장 심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이런 거시 변수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이번 베센트 장관의 행보는 단기적인 안정과 장기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 몇 달간 국채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기회를 찾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정리
- 베센트 장관,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 발표
- 단기물 55%, 장기물 45% 비중으로 시장 안정 시도
- ‘바이백’으로 장기 금리 억제, 심리적 안정 효과
- MMF 시장 소화 한계와 연준 개입 가능성
- 인플레이션 재발 시 계획 전면 수정 가능성